작가
작가소개
방혜자 작가(1937년생)는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래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적인 정서를 토대로 서구의 기법과 사조들을 체득하고 자신만의 실험정신과 조형언어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빛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주와 생명,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를 작품으로 구현한 화가로 평가받는다
1961년 서울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방혜자 작가는 서울 국립도서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여비를 마련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유학시절 다양한 미술 사조를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미술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63년 프랑스의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인 피에르 쿠르티옹과 교유하기 시작했고 그의 도움 등으로 1967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68년 한국에 잠시 귀국했으나 1976년까지 체류하게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전통 한지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1971년부터 한지 콜라주 실험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우주와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이를 자신의 창작에 적극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6년 〈우주의 노래〉를 제작했고 같은 해 프랑스로 다시 이주했다.
프랑스로 돌아간 방혜자는 ‘우주, 생명 그리고 빛’이라는 문제의식에 더욱 깊이 천착해나갔다. 1980년대 후반 ‘우주 시리즈’를, 1990년대 중반 ‘생명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다. 1996년 프랑스 남부 루씨용 지역의 황토를 발견하고 그것을 안료로 사용했다. 흙을 통해 자연의 빛과 원초적 생명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한지와 무직천의 특성을 적극 활용했다.
방혜자 작가는 2000년 경기도 광주시의 영은미술관 경안창작스튜디오에 입주했다. 이후 매년 한 차례 영은미술관을 찾아 머물며 창작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찾지 못했다.
방혜자 작가의 미술은 ‘빛-우주-생명’으로 요약된다. 그는 빛, 우주, 생명을 통해 인간의 내면은 물론 자연과 예술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해왔다. 그는 지금까지 이러한 창작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해왔다. 방혜자 작가는 이를 위해 재료와 기법 등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다. 캔버스에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하는 콜라주 기법를 도입하고, 종이를 구기고 펴서 무수한 굴곡을 만들고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생동감을 부여하며, 한지의 앞뒷면에 반복 채색하는 배채를 통해 깊은 공간감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재료와 기법의 혼용과 실험을 통해 빛과 우주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다.
방혜자 작가는 파리 길상사(송광사의 파리 분원)와 서울의 개화사, 보각사에 방혜자 스타일의 불화를 제작해 설치했다. 우주와 생명을 아우르는 심원한 분위기의 작품을 불화로 제작함으로써 현대 불교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도 했다. 2018년 방혜자 작가의 작품 4점이 프랑스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실의 새로운 유리화(스테인드글라스)로 선정되었다. 방혜자 작가의 ‘빛의 미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작품은 2021년 설치될 예정이다.
방혜자 작가는 창작뿐 아니라 280여 차례에 걸쳐 전시를 가졌다. 한국과 프랑스는 물론 독일의 잉겔하임 위베르린겐, 스위스의 제네바 오베르니에 뇌샤텔, 스웨덴의 스톡홀름, 캐나다의 몬트리올, 미국의 뉴욕, 벨기에의 브뤼셀 리에쥬,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등지에서 전시를 통해 세계인과 만났다.
2000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80대의 노화가 방혜자는 프랑스 파리와 아죽스 작업실을 오가며 창작에만 매진했다. 한눈 팔지 않고 성찰과 창작의 외길을 걸어온 화업 60여 년. 그가 창작한 작품은 2020년 현재 1,300여 점에 달한다.

작가약력
196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61년 파리 유학 1963년 파리, École des Beaux-Arts, 프레스코 작업실에서 르 노르망(Albert Le Normand), 오쟘(Jean Aujame) 교수에게서 수학(~1966)
미술평론가 피에르 쿠르티옹(Pierre Courthion)을 만남
1964년 뫼동(Meudon), 러시아 연구센터(Centre d' études russes)에서 이콘화 기법(la technique de l’icône) 연구(~1966)
1970년 파리, 국립 공예학교(É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Appliques et des Metiers), 색유리화(vitrail) 수학
1971년 한지 콜라주 기법시작
1983년 파리, 헤이터 판화공방 '아틀리에 17'(l’atelier 17 de Hayter)에서 판화기법 연구
1988년 21회 몬테카를로 국제 현대예술대상, ‘성(聖) 문화상’ 수상
1996년 루씨용(Roussillon)의 황토 사용하기 시작
2008년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런 경기인상' 수상
2008년 제2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대한민국 미술인상 특별상 해외작가상’ 수상
2010년 문화의 날,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수상.
2018년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실 유리화 제작 작가 선정
전시
1961년 《방혜자 개인전》, 서울 국립도서관화랑
1961년 《파리의 외국화가들》, 파리시립현대미술관
1967년 《방혜자》, 파리 휴스턴브라운갤러리
1970년 《방혜자》, 파리 메디외 국제회관
1976년 《방혜자 작품전》, 서울 현대화랑
1980년 《방혜자》, 파리 자끄 마솔 갤러리
1982년 《방혜자 작품전》, 서울 현대화랑
1988년 《방혜자 작품전 : 물성과 빛》, 파리 한국문화원, 서울 현대화랑
1991년 《방혜자》, 파리, 유네스코 에스빠스 미로
1994년 《방혜자》, 서울 갤러리현대, 박영덕화랑
1996년 《방혜자》, 파리 한국문화원, 뉴욕 앙리코 나바라 갤러리
2000년 《아트 바젤 31》
2000년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 1950 년대~1960 년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03년 《방혜자 : 빛의 숨결》, 파리 생 루이 드 라 살뻬뜨리에르
2005년 《방혜자 : 빛의 숨결》, 서울 갤러리현대
2007년 《방혜자 최신작》, 파리 갤러리기욤
2007년 《방혜자 : 빛의 숨결》, 서울 환기미술관, 도쿄 미술세계
2008년 《선택된 종이》, 프랑스 솅트뤠이유미술관
2008년 《한국추상회화 : 1958~2008》, 서울시립미술관
2009년 《방혜자 : 빛의 길, 色彩의 詩學-마음의 빛》, 광주 영은미술관
2011년 《2011 아르 파리》, 파리 그랑팔레
2011년 《방혜자 : 빛의 울림》, 서울 갤러리현대, 두가헌갤러리
2012년 《방혜자 : 마음의 빛》, 프랑스 보귀에 성
2012년 《방혜자, 조광호 스테인드글라스 기획초대전》, 서울, 노암갤러리
2013년 《방혜자 : 빛의 춤》, 브뤼셀, 한국문화원
2015년 《하얀 울림 : 한지의 정서와 현대미술》, 원주 뮤지움 산
2015년 《서울-파리-서울 : 프랑스의 한국화가들, 한국의 형상》, 파리 세르누치미술관
2016년 《방혜자 : 빛의 노래》, 광주 영은미술관
2016년 《방혜자 : 성좌》, 서울 갤러리현대
2018년 《파리의 한국화가들 : 1950~1969》, 대전 이응노미술관
2019년 《Bang Hye Ja: Mattiere Becomes Light》, Cernucci Museum of Art, Paris

비평글
비평글 바로보기 
빛을 향한 영원의 시선
방혜자 연구팀 연구원: 기영미
<목차>
1. 서론
재불작가로 현재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방혜자는 한국현대미술의 유형적 맥락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이다. 파리와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작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의 미술언어는 ‘빛’이라는 개념적 시선으로 향해 있으면서도,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서구 경향들과 한국전통의 개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끊임없이 수필과 시 등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서예와 기공, 명상을 하며 작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방혜자가 서울대 미대에 입학한 시기는 뉴욕을 중심으로 추상표현주의의 물결이 번지던 시기였고, 유럽에서는 앵포르멜 미술이 휩쓸던 시기였다. 국내 화단의 분위기도 당대 서양 현대미술의 수용과 무관하지 않았고, 방혜자 역시 전위적인 미술을 수용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미술 사조를 공유하였다. 파리 유학 생활 중 관람한 많은 거장들의 작품과 앵포르멜 작가들의 전시 그리고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앵포르멜의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표현과 마티에르의 강조 역시 방혜자의 작품 형성에 시사점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파리 국립미술학교(École des Beaux-Arts)에서의 프레스코 아틀리에의 수업과 판화, 이콘화, 유리화(스테인드글라스) 등의 수업은 이후 방혜자 작품의 다양한 매체와 재료에 대한 실험과 탐구에 근간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방혜자의 졸업작품전에서 선보인 작품들과 파리 유학시절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마티에르의 다양한 실험과 비재현적인 추상성은 당대의 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혜자 작품에 나타나는 재료의 탐구와 물질성을 단순히 당대 경향의 영향이라는 포괄적인 일반화로 범주화할 수 없는 것은, 그녀가 끊임없이 재료와 기법을 통해 화면의 물성을 탐구하고 실험하면서도 빛, 우주, 생명과 같은 비물질적인 정신적 세계를 궁구(窮究)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 방혜자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빛의 화가’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마치 모네와 인상파,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로 떠올리듯 방혜자의 시선은 늘 빛을 향하고 있다. 그 빛은 대상의 형태나 외형의 재현이 아닌 우주, 생명, 대지, 숨결, 진동, 하늘과 땅, 은하수와 같은 대상 너머의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어린 시절 개울가의 흐르는 물을 보며 반짝이는 햇빛을 그리고 싶었던 때부터, 파리에 도착하여 베르메르전시1)에서 빛의 색채에 감동을 받으며, 루씨용의 황토에서 반짝이는 입자와 색 에너지를 발견했을 때에도 ‘어둠에서 어떻게 하면 빛의 세계로 갈까 하는 마음이 강렬했던’2) 방혜자의 관심은 빛이었다. 그 빛은 어둠과 카오스로부터 모든 것(대상/사물/자연)을 비추는 빛이기도 하고 색채이기도 하다. 또한 기쁜 마음, 환희와 같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밝음이기도 하며 우주의 무한함과 극미의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아우라와 같은 것이다. 시인 김지하가 방혜자의 작품에 대해 ‘신성한 흰 빛’ ‘흰 어둠의 공간’, ‘빛나는 우주의 흰 그늘’ ‘개벽’으로 표현했듯이3) 방혜자의 빛은 물질적이기 보다 관념적이며 정신적인 것이다.
일견 방혜자의 작품의 빛, 우주, 생명과 같은 근원적이고 정신적인 개념들과 재료의 물성인 물질적인 개념은 의미와 형식의 간극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비-물질적인 빛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물질성이 강한 종이(닥지), 가죽, 사포, 톱밥, 헝겊, 무직천, 모래, 흙의 재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마티에르에 대한 연구’4)를 지속해왔다. 또한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콜라주(collage), 한지구김기법, 지점토(papier mâché) 등의 매체와 기법에 대한 탐구와 모색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방혜자의 회화는 일루젼을 통한 회화의 2차원적 평면성에서 벗어나 있으며, 회화의 평면적 화면은 두터운 마티에르에 의해 층위의 두께와 깊이를 획득하게 된다.
그녀가 지속적으로 탐구한 재료에 의한 물질성의 특징이 더욱 ‘빛’이라는 관념적 개념 속에 투영되는 지점은 질료와 매체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료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은 이후 공간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면서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이며 ‘공간특정적(space-specific)’인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파리와 한국에서 열린 대형전시에서 작품들은 장소의 건축적 배경과 공간에 조응하여 새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즉, 평면적인 회화는 특정 장소와 공간 속에 오브제가 되기도 하며 설치미술이 되기도 한다. 특히 2018년에 샤르트르대성당 옛 종교참사회의실에 스테인드글라스 공모에 선정되어 제작한 4개의 유리화5)는 장소와 공간 속에 작품이 만나 새로운 경험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방혜자 작가는 60여년의 화업을 통해 1300여점의 작품을 남겼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작업과 전시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혜자의 화업과 전 작품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촘촘히 들여다보기에 지면상 부족하지만, 편의상 방혜자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최근 작업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구분하여 작품의 특성과 화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초기 작업: 1950년대
방혜자는 경기도 고양군 능동마을(지금은 서울 편입)에서 교사였던 부모 슬하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45년(초등학교 1학년) 해방을 맞고, 중학교 1학년 때에 6.25(1950)전쟁과 대학 4학년 때 4.19(1960)를 겼었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님을 비롯하여 그림을 그리셨던 외할아버지와 외사촌오빠(화은 김돈식)6) 역시 그녀의 예술적 뿌리라 할 수 있다. 방혜자가 본격적으로 미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경기여고 재학시절이다. 경기여고 재학시절 스승인 화가 김창억 선생의 가르침7)으로 불문과에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윤경렬 선생과의 만남8)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방혜자는 김창억 선생의 격려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1956)하게 된다. 방혜자의 첫 유화작품 <서울풍경>(1958)과 첫 개인전에 소개된 30여점의 유화작품들은 구상회화임에도 강렬한 붓 터치와 팔렛 나이프로 문지른 색면 처리와 물감의 두터운 마티에르 등 당시 우리 미술계를 휩쓴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3. 마티에르의 탐색:1960년대-70년대 중반
3.1. 파리유학시절(1961~67): 콜라주, 글라씨, 프레스코 기법의 탐색과 실험
서울대 대학시절에 그녀의 입학동기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세계적 유행의 새로운 미술조류에 공감하였고,9) 파리 유학 시절 서구적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싶었다고 회상한 것처럼(올리비에 제르망 또마와의 대담, 1987), 당시 앵포르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파리화단에서의 마티에르(matière)의 다양한 실험에 관심을 보였다. 파리에서 본격적인 수업은 1963년 에콜 데 보자르의 벽화 아틀리에에서 시작되는데, 이후 3년간 지속된 이 수업 시기에 방혜자는 건축적 공간을 조형화하는 ‘기념비적 미술(l’art monunental)’에 눈을 뜨게 되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 또한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래와 석회를 섞어 질척하게 개어 바르고 이를 나이프로 문질러 매끈한 표면을 만드는 ‘글라씨(Glaci)’ 기법10)은 에콜 데 보자르의 벽화 아틀리에서 르 노르망 교수로부터 배운 프레스코 기법으로 아직도 즐겨 쓰고 있다.
이 시기 방혜자는 두터운 마티에르와 물감표면을 긁거나 흔적을 남기고, 가죽과 사포, 단추 등을 물감 표면에 붙여 콜라주의 기법을 혼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67년 파리 휴스턴 브라운 갤러리 개인전 서문에서 피에르 쿠르티옹(Pierre Courthion)은 방혜자의 작품에서 물감의 두께가 표현력을 발하고, 가죽을 붙이거나 모래를 혼합하여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앵포르멜 작가들이 재료와 기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했던 미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방혜자는 이러한 새로운 미술경향을 자연스런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50-60년대의 유학생처럼, 방혜자 역시 프랑스에 도착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11) 1963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École des Beaux-Arts)하여 프레스코 아틀리에에서 1966년까지 오쟘(Jean Aujame), 르 노르망(Albert Le Normand)교수 등에게 수학한다. 이 시기 방혜자의 일생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인 피에르 쿠르티옹씨를 만나게 되고 그의 소개로 화가 자오우키(Zao Wou-Ki), 이자벨 루오(Isabelle Rouault), 레옹자크(Léon Zack)와 로베르 클랭(Robert Klein) 등을 만나면서 파리 화단의 작가들과 교류하고 틈틈이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의 천국 같았던 60년대의 파리를 발견’12)하게 된다. 또한 1964년 뫼동(Meudon)의 러시아 연구소(Centre d’études russes)에서 이콘화 기법을 배우고, 1966년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열린 《베르메르의 빛 속에서》展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빛’을 그리겠다는 내면의 의지를 재인식했다고 한다.
방혜자는 당대 파리화단에서 서구적인 기법을 수학하고 수용하였지만, 세계 주류 미술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형식을 빌려와 한국적 전통이라는 뿌리를 접목시킴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상호적인 만남을 시도하였다. 방혜자 자신이 프랑스에 도착해서야 한국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고 회고한 것처럼, 유학시절 방혜자는 서구적인 기법을 수용하면서 동양화 붓과 서양화 붓을 동시에 사용하고, 한지와 마포, 나무 위에다 유채를 사용하는 등 동양과 서양의 기법들을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정립해 나갔다.
3.2. 한국체류시절(1968~76): 한지(닥지)를 이용한 재료의 실험
1967년 12월 알렉상드르 기유모즈(Alexandre Guillemoz)와 결혼한 방혜자는 1968년 1월 남편과 함께 잠시 귀국했다가 1976년까지 거주하게 된다. 조각가 김주영 선생 청탁으로 서울 미대에서 벽화를 강의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면서 작품에 더욱 한국적인 미의 개념을 표현하게 되는 시기이다. 귀국 후 가진 첫 개인전을 신세계화랑에서 갖고,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과 전시 및 강의활동을 하게 된다. 1969년에는 벌교와 제주의 성당에 벽화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파리를 오가며 스테인글라스 수업(1970년)과 판화공방에서 판화를 연구(1972)하고, 신세계화랑, 갤러리 현대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다.
특히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한지에 대한 재료의 탐색과 종이 구기기와 주름, 구겨진 주름 위의 물감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들을 실험하고 체화하는 과정이 보여진다. 1971년에는 한지(닥지)를 사용하여 콜라주 작품을 처음 시작하였다. 신세계화랑에서 열린 개인전 작품 <부활송>(1972)13)은 방혜자가 귀국 후 국내 첫 전시로 열린 1968년 신세계화랑(신세계백화점 7층)에서 지인으로부터 닥종이를 알게 되었고14) 이 작품은 최초의 닥종이를 사용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캔버스 유화 작품위에 종이를 붙인 파피에콜레(papier collé) 작품으로로 화면에 마티에르를 두껍게 하고 다양한 재료를 혼합한 콜라주 작업이다.
1975년 신라 고분발굴에 영향을 받은 <어둠을 뚫고>(1975-76)시리즈15)와 1976년 제작한 <우주의 노래>(1976)16), 파리로 거처를 옮기면서 1977년 제작한 <햇님 나들이(태양의 산책)>(1977), <빛을 찾아서> 등도 유화 위에 종이를 붙이는 콜라주 작업으로서 같은 실험을 보여준다. 이 시기 작품의 재료와 특징으로 보아 한국 체류시절 탐구하던 한지를 이용한 재료의 실험이 파리로 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태에 있어서는 주로 원형 작업을 했는데, 때로 <빛을 찾아서Ⅱ>(1975)처럼 사각형의 작업으로 변형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70년대에 작품들에서는 비록 캔버스라는 2차원적 평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실험을 보여준다. 특히 귀국 후 새로이 발견한 한지캔버스에 유화물감과 톱밥, 사포, 한지, 나무 다양한 재료들을 콜라주하는 방법과 두껍게 바른 물감의 층을 긁어 자국을 내어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4. 매체와 재료의 실험을 통한 ‘빛’의 형태와 공간 탐구: 1980년대~1990년대
작가는 1976년 5월 갤러리 현대에서의 개인전을 끝으로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정착한다. 1981년 파리 가면극학교에서 서예 강의를 시작하고, 서울과 파리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우선 1983년 헤이터 판화 공방 ‘아틀리에 디셋트(Atelier 17)’에서 1987년까지 다양한 판화기법을 연구하는데, 1972년 파리의 라쿠리에르-프렐르(Atelier Lacourière et Frelaut) 판화공방에서 판화 연구17)를 하고 다시 헤이터 판화공방에서 공부를 하며, 최근까지 다양한 판화작업을 선보여 왔다.18)
앞에서 살펴본 1970년대에 선보이기 시작한 원형, 동심원 형태의 작품들은 1980년대 이후 ‘우주’를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다시 등장함을 볼 수 있다.19) 1970년대의 우주에 대한 원형 작품들이 주로 한지 콜라주로 되어 있다면, 1980년대 후반의 작품들에서는 한지구김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한지구김기법이란 한지를 구겼다가 다시 펴서 물감을 바르고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 다시 물감을 바르는 기법으로 붓자국과 형태들은 더욱 유연하고 자유로워진다.
1987년부터 제작한 우주 시리즈를 통해 방혜자는 한지 구김기법을 이용하여 색을 여러 번 겹침으로서 밑의 색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양면채색기법20)으로 ‘빛’을 색채로 표현하는 투명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뒷면에 바른 물감이 앞면의 한지에 우러나오도록 하는 이 기법은 한지의 투명성과 흡습성 그리고 부드러운 표면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서 무한한 공간감과 우주와 빛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법으로 방혜자가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한 <유성공전(유성)>, <춤추는 별들(별들의 춤)>과 같은 작품은 우주의 공간감과 에너지, 극미의 세계와 무한한 세계가 공존하며 유성과도 같이 움직이는 듯 보인다. 위베르 리브(Hubert Reeves)나 다비드 엘바즈(David Ellbaz)와 같은 천체물리학자들이 방혜자의 작품이 마치 자신들이 추구해온 우주의 이미지들과 맞닿아있다고 하면서 실제 천체의 사진과 방혜자의 우주시리즈 그림들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1989년에는 파지를 이용한 ‘지점토(종이찰흙) 기법’21)을 개발하고 <대지의 피부>를 제작하는데, 종이를 물에 불려 두껍게 겹쳐서, 마치 부조와 같이 더욱 두터운 효과를 보여준다. 이전의 물감의 두터운 마티에를 이용한 작업들과 파피에콜레로 종이를 겹쳐 붙이는 작업들보다도 더욱 입체감이 있다. 방혜자의 물감과 재료는 모두 자연접착제와 ‘개어서 자신이 만들어서 쓰는 물감’22)으로서, 한지 또는 무직천의 앞면과 뒷면을 따로 칠하고 겹치게 칠해 서로 어우러지면서 미묘한 색의 뉘앙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임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편, 방혜자의 작품에 또 하나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루씨용의 황토의 발견이었다. 1996년 루씨용의 황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루씨용의 황토분은 ‘무엇보다도 빛의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적절한 재료’가 되었으며, 방혜자에게 루씨용의 황토(모래)는 ‘강렬한 색의 진동과 흙과 종이를 결합할 수 있는 작품의 중요한 영감의 원천’23)이 되었다. 1997년에는 새로운 합성 재료 ‘제오 텍스타일’24)을 발견하여 투명한 닥지의 효과를 대신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방혜자가 더욱 빛 그 자체에 천착하게 된 것은 남프랑스 루씨용의 황토와 무직천(부직포, 제오 텍스타일, 비딤 등 주24참조)을 사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윤난지는 이 시기를 ‘가히 재료 발견의 시대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루씨용의 황토를 비롯하여 방혜자가 사용한 자연 안료들은 빛을 반사하며 공간감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기게 직조되어 물감이 통과하는 무직천의 질감 역시 빛의 깊이와 투명함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인 재료들인 것이다.
방혜자 작업을 연구하고 전시평론을 쓴 비평가 질베르 라스코(Gilbert Lascault)는 이 새로운 재료 ‘무직천(제오 텍스타일)’에 대해 “이 천은 한지의 맑은 느낌이나 구겨짐에서 보이는 왕성한 운동감은 덜하지만 섬유 조직이 세밀하게 서로 엉겨있어 깊이 있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보존도 쉽다. 작가는 이 섬유의 앞, 뒷면에 자연 염료를 묻힌 붓으로 그린다. 때로 돌가루, 황토, 모래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여 무직천과 루시용의 황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재료 무직천과 루시용의 황토의 발견은 방혜자의 작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되는데, 이 두 재료 모두 ‘빛’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작업은 더욱 다양한 기법으로 ‘빛’을 구사하는 듯 보인다.
5. 우주와 생명의 빛을 담은 공간특정적(space-specific)작업: 2000년대~201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혜자는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국내외에 많은 전시를 가졌다. 2000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영은미술관 경안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되면서 방혜자는 파리와 한국을 자주 오가며 전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방혜자는 파리의 작업실과 남불 아르데쉬(Ardèche)의 아죽스(Ajoux) 작업실에 이어 영은 레지던스 작업실을 오가며 더욱 활발한 작업에 몰두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전시에 참여하게 된다.25)
2000년 이후 최근 방혜자는 기존에 작업하던 주제와 화풍들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속하면서 공간적인 지경을 넓힌다. 현재 파악된 전시자료 285회의 전시들 가운데 2000년 이후의 주요 전시와 화업 가운데 공간과 장소, 장르의 확장의 측면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방혜자의 매체와 장르에 대한 표현영역이 매우 폭넓게 편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스위스 브루셀에서 열린 전시에 조각 작품26)을 출품, 같은 해 열린 영은미술관 전시 <새로운 빛으로, 생명으로>展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원통형으로 입체 전시, 2002년 성곡미술관 전시에서 <생명의 빛>과 <우주의 빛>등 대형 작품(두 작품 모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 소장)을 전시, 2003년 파리 샬페트리에르에서 대형 전시, 강화도 전등사 장서각(2005) 전시, 광주요 도자문화원에서 첫 도자 그림을 전시, 2009년 강화도 원주 토지문학관에서 로즐린 시빌과 시화전을 가지며 시화집 『침묵의 문』을 출간한 것, 2012년에는 독일 파데르본에 있는 페테르스 유리공방에서 유리화 작업을 시작하고 같은 해 조광호 신부와 한국에서 <유리화(스테인드글라스) 2인전> 전시, 2014년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지름125cm의 유리화 <하늘과 땅>을 설치한 것 등 갤러리, 미술관에서 벗어나 공간의 장소적 특성과 조응하는 작품들과 조각, 도자기, 유리화, 솜을 채워 넣은 바느질 작업과 일상의 수작업 혼합매체 작품들 등 다양한 장르의 확장을 다양하게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부터 방혜자가 작품에서 실현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실험은 ‘모든 장르,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포용의 미학을 실천’27)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간’과 작품과의 조응을 실현한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이면서 공간 특정적(space-specific)인 전시방식은 2003년 5월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생-루이 소성당(Chapelle Saint-Louis de la Salpêtrière, Paris-현재는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음)28)에서 열린 방혜자의 개인전은 그의 회화 작품들이 특별한 장소와 공간을 만나 새로운 ‘빛의 공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전시다.
이 전시에서 살페트리에르 소성당 예배당 벽의 건축적 특성에 따라 평면적인 회화 작품들은 창문의 빛을 받도록 바닥에 놓았고, 실린더 형태로 둥글게 말아 천정에 매달거나, 캔버스라는 틀이나 액자틀 없이 무직천 그대로 벽면에서 흘러내리도록 연출하였다. 중앙 돔(Dome) 아래 공간을 위해 제작한 대형 작품(500×205cm) <빛의 눈>은 소성당의 벽면 공간을 차지하고, 성당 바닥에는 원형 작품이 천정으로부터 매달린 실린더 모양의 작품이 ‘설치 install’ 되어있다. 이같은 연출로 인해 작품들은 화이트큐브 미술관의 전통적인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살페트리에르 생-루이 소성당의 제단(alter), 돔,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건축적 배경과 어우러지도록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장소-특정적 설치미술이 되었다. 따라서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만드는 특정한 공간이며 작품을 통해 ‘빛’을 체험하도록 특별하게 선택된 장소로서, 작품들과 건축적 배경이 서로 조응하는 총체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대표작품 분석 작품이미지 참조),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방혜자의 작품에서의 빛과 만나 비물질적인 공간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방혜자 작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화업은 샤르트르대성당 종교 참사회의실 스테인드글라스를 위한 유리화 작업(Vitraux pour la salle capitulaire de la Cathédrale de Chartres)일 것이다. 방혜자 작가는 2018년 샤르트르 대성당 종교 참사회의실에 새로 설치되는 4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작가로 선정되었다.29) 4개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북쪽 창에 두 개 남쪽 창에 각각 두 개씩 설치될 예정이다. 이 작품들은 2012년부터 독일 페테르스 공방에서 유리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작한 작품들로서, 이전의 방혜자의 회화작품들에서 보여지는 형태들을 조합한 거대한 빛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스테인드글라스 아치형태의 창은 승천을 표현하며, 기존 회화작품들의 직사각형 작품들과 원형 작품들이 하나로 만나며 동심원의 원형에서부터 확산되는 빛이 세로의 수직형태의 빛의 길과 만나 창조주의 세계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방혜자가 샤르트르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파리 유학시절부터 프레스코와 이콘화, 유리화, 판화 등을 익히며 다양한 기법과 재료들을 실험해온 작업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 프랑스 국립 공예학교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수업을 받은 것, 2007년 환기미술관에 설치된 유리화 작업을 선보인 것, 2012년 페테르스 유리공방에서 유리화 작업을 시작한 것, 조광호 신부와의 「유리화 2인전」(노암갤러리, 2012)을 연 것 등의 경력은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샤르트르대성당에 설치작가로 선정되기 위한 여정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방혜자의 작품들은 그동안 작업해온 다양한 형태의 빛과 우주, 생명의 숨결을 보여주며, 장소와 공간특정적인 시공간을 함께 드러낸다.
6. 결론
방혜자의 예술은 작가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삶의 걸어온 길과 연결되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혜자는 60여년의 작업활동을 거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작가의 길을 걸어왔다. 다양한 마티에르의 탐색과 모색뿐 아니라 평면회화에서부터 조각, 설치, 판화, 도자기 작업, 무대장치의 연출과 의상의 제작 등 장르에 구별을 두지 않고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은 화이트큐브 공간에서 작품 자체를 위한 제공된 공간에서뿐 아니라 방혜자의 작품과 작품을 둘러싼 장소와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공간의 조형화는 본문에서 살펴본 살페트리에르 성당 설치 작업 이외에도, 1969년의 벌교와 제주 성당의 벽화30)라든가 불교 사찰을 위한 작품들31) 등 종교적 공간에서의 작업들에서 나타난다. 최근 작업을 완성하여 설치를 앞둔 샤르트르대성당 종교 참사회의실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역시 특별한 건축적 공간과 작품이 만나게 되는 경험적 공간이 될 것이며 명상의 공간이 될 것이다. 살페트리에르 성당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실제의 빛이 작품에 반영되도록 연출하였다면, 샤르트르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 자체가 ‘빛’을 구현한 작품이자 빛이 들어오는 통로로서 작품과 공간이 빛 자체로 환원되는 경험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시인이 되려다 화가로 진로를 바꾸게 된 방혜자는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녀의 예술과 삶에서 글쓰기를 지속해왔다. 방혜자의 『마음의 소리』(1986), 『마음의 침묵』(2001) 등 수필집과, 샤를 줄리에와 함께 출간한 시화집 『그윽한 기쁨』(샤를 줄리에 시, 방혜자 그림, 2002), 불어로 번역한 선시(禪詩) 모음집에 방혜자의 글씨를 수록한 『천산월(天山月』(2003)32), 시인 로즐린 시빌과 함께 출간한 『침묵의 문』(2009) 등의 출판은 그녀의 그림과 시, 서예에 대한 각별한 관심사를 보여준다. ‘서예, 기공, 그림, 시 등 모든 예술적 방법들은 우리에게 현현하는 빛을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힌 것처럼, 그녀에게 문학과 미술은 빛을 향한 예술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방혜자에게 전통문화에 눈을 뜨게 해준 존경하는 스승 윤경렬 선생을 기리며 발간한 『만불의 산』(2002)은 불어로 번역되어 자신의 글과 함께 출판하였고, 김지하의 첫 불역시집 『화개』(2006) 역시 불어로 번역되어 방혜자의 그림(수채화)과 함께 발간되었다. 서예와 기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방혜자의 내면에 흐르는 한국전통의 대한 애착과 동양적인 자연관을 드러내며, 작품에서 ’빛‘, ’우주‘, ’생명‘의 정신성으로 연결된다.
끊임없이 ‘빛’을 추구해온 방혜자의 작품들은 제목에서도 ‘빛’이 절대 다수가 된다. 대지의 빛, 마음의 빛, 빛의 탄생, 빛의 숨결, 빛의 노래, 빛의 논, 여명, 섬광 등 빛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빛의 재현을 넘어 내면의 빛 혹은 심상의 비추는 억겁의 공간을 아우르는 작품들은 빛의 움직임, 빛의 파동, 빛의 숨결, 빛의 공백을 드러내며, 대우주와 극미의 세계가 공존하는 추상적인 ‘빛’과 ‘우주’로 환원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본연의 뿌리를 찾으며 생명과 우주의 심연을 빛과 색채로 표현하는 작품들이다. ‘빛’을 탐색하는 표현은 여전히 그동안의 화업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물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재료들과 물질적인 질료의 물감을 사용하면서도 작가의 사유의 방향과 시선은 비물질적인 ‘빛’으로 향해 있다. 가령, 부조와 같은 두꺼운 물질성을 드러낸 작품에서조차 <새벽>, <빛의 탄생>과 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지향점은 빛을 향한 탐구로 귀결된다. 세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우주의 먼 곳으로 향하는 ‘빛’을 향한 방혜자의 영원의 시선! 그것은 방혜자가 작품을 지속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질 지향점이 아닐까?

시기별 작품해설
작품해설 바로보기 
방혜자의 시기별 작품해설글
방혜자프로젝트팀 연구원/기영미
*일러두기: 시대별 작품의 특성 설명은 방혜자 비평문 참조.
1. 1950-60년대초
도1. <서울풍경(Vue sur Séoul)>, 캔버스에 유채, 76×51cm, 1958.
이 작품은 서울대 재학시절 불어를 배우기 위해 다니던 불문학연구소에서 창밖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화면 상단에 뾰족한 지붕은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이다. 구상적인 풍경들 위로 마티에르의 강조와 분방한 필획들이 보인다. 당시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전위적인 미술사조의 수용이 보인다. 이 작품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전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도2. <지심(地心, Au Coeur de la Terre)>, 캔버스에 유채, 100×81cm, 1961.
이 작품은 경주여행 후 석굴암의 인상을 그린 작품으로 구상적인 형태가 거의 사라진 추상작품으로, 방혜자의 첫 추상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방혜자는 당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병기 선생과 유영국 선생이 운영하던 현대미술연구소에서 작업하였는데, 이 시기의 전위적인 경향의 추상성과 앵포르멜의 마티에르의 강조가 보인다.
도3. <제목없음>, 캔버스에 유채, 사포(Huille sur toile, papier de verre), 100×65cm, 1961.
이 시기 화단의 경향을 말해주듯, 추상적인 표현과 거친 물감의 마티에르가 강조되고 있다.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그리고 사포를 붙여 콜라주를 시도한 작품이며, 어두운 배경 속에 중앙에 ‘빛’의 표현이 주목된다.
2. 1960-1970년대
1960년대와 70년대의 작품들은 유화물감을 두텁게 바르고 표면을 긁거나 흔적을 남기는 등 두터운 마티에르로 질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 방혜자의 작품에서는 당대 파리화단에서 주류로 확산되고 있던 앵포르멜적 요소가 보이지만, 비평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주류 미술의 단순한 수용이라기보다 그러한 형식을 어는 정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전통을 접목시키며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만남을 시도하였다.
도4. <제목없음>, 1965.
도5. <제목없음>, 1965.
도4 작품은 유화물감을 두텁게 바르고 가죽, 사포, 단추 등을 물감 표면에 붙여 질감표면을 강조한 작품으로서 1960년대 마티에르의 강조와 재료의 실험을 잘 보여준다.
도5 역시 추상적인 작품으로 화면의 질감을 두텁게 바르고 물감의 표면을 긁어 흔적을 만들고(좌측 흰 색 물감 칠해진 부분) 중앙에 사포를 붙여 콜라주 기법을 보여준다.
도6. <물성과 빛, Matière-Lumière>, 캔버스에 유채, 사포, 가죽(Huille sur toile, papier de verre, cuir), 65×91cm, Paris, musée Cernuschi, 1969.
이 작품의 경우, 물감의 질감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밝은 빛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함으로서 빛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작품들 중에 하나로 주목된다. 기하학적 사각형과 원형, 반원형의 추상적인 형태 속에 부분적으로 흰색과 밝은 노란색조로 밝은 빛의 광원을 표현하고 있으며 1960년대 중엽을 넘어서면서부터 밝고 투명한 색조로 변화하는 화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도7. <탈춤Ⅰ, Danse masquée>, 캔버스에 유채, 톱밥, 파피에 콜레, 100×100cm, 신세계연구센터소장, 1971.
유학생활 중 1967년 알렉상드르 기유모즈(Alexandre Gauillemoz)와 결혼한 방혜자는 이듬해 남편과 함께 잠시 귀국했다가 1976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강의와 전시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귀국후 가진 첫 개인전(신세계화랑)에서 한지의 닥종이를 알게 되면서, 한지를 구기고 주름을 만들고 구긴 주름위에 물감을 바르면서 얻어지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한지를 꼬고 잘라 붙인 파피에콜레, 콜라주 작품들을 제작한다. 이 작품은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바르고 한지를 콜라주한 작품으로서 이 시기 한지(닥종이)에 대한 실험과 모색을 보여준다.
도8. <부활송>, 캔버스에 유채, 파피에콜레, 135×135cm, 1972.
이 작품은 작가가 귀국후 열린 첫 개인전(1968년 4월, 신세계백화점 7층 전시실)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잠자리 날게 같이 가늘고 얇은 종이’ 즉 닥지를 알게 되었는데, 닥지의 질기며 비단과 같은 부드러운 특성에 반해 이때부터 닥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부활송>은 ‘최초로 닥지를 사용’한 콜라주 작품이다(2020. 8월 작가와의 화상인터뷰 확인)
도9. <심저의 빛>, 캔버스에 유채, 톱밥, 파피에 콜레, 42×55cm, 1974.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이 작품에서처럼 톱밥을 이용하여 마티에르를 강조하거나 한지를 꼬아서 입체적인 느낌을 살리고 물감을 두껍게 발라 그 위에 팔레트 나이프로 물감을 긁어 흔적을 내는 등 물성의 질감에 대한 탐구와 모색을 보여준다.
도10. <어둠을 뚫고: 하(夏>), 캔버스에 유채 및 파피에 콜레, 80×80cm, 1975.
도11.<어둠을 뚫고 Ⅱ>, 캔버스에 유채 및 파피에 콜레, 80×80cm, 1976.
두 작품은 1968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신라 고분발굴에 영향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서 캔버스에 유화물감과 한지의 콜라주 작품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둥근 원형과 원반 형태들이 등장하는데, 빛이 품은 생명을 담는 무한 공간 우주를 상징한다. <어둠을 뚫고>라는 제목의 작품은 총 4개의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살펴본 두 작품 이외에 <어둠을 뚫고: 추(秋)><어둠을 뚫고: 동(冬)>이 있다.
도12. <우주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 한지, 톱밥, 콜라주, 100×100cm, 1976.
위의 두 작품 <어둠을 뚫고서> 시리즈와 같이 한지를 이용한 재료의 실험이 보여지고 있으며 태양이나 우주의 상징인 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빛’이라는 비물질적인 세계를 원형의 상징적인 형태로 구현하고 있으며, 배경의 어두운 색조에 비해 빛의 근원인 밝은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이같이 1970년대 작품의 특징은 재료와 매체의 다양한 실험과 함께 ‘우주’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작품의 제목으로 부각되면서 원형의 형태가 작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13. <햇님 나들이(태양의 산책), Promenade Solaire>, (버드나무 판 위에) 종이에 유채 및 파피에 콜레, 직경 26.5cm, 1977.
이 작품은 직경 26.5cm의 작은 원형 버드나무 판 위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유화 물감을 바르고 다시 여러 겹의 종이를 붙인 작업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태양과 햇님의 밝은 광원과 빛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기법적으로는 나무줄기 혹은 가지처럼 표현된 갈색 선들은 닥지를 꼬아서 붙인 것으로 마치 부조와 같은 느낌을 준다. 1970년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원형 형태는 빛의 탐구와 빛의 근원인 태양과 우주를 상징하는 공간의 형태이기도 하며, 1980년대에 우주 주제의 그림에서 다시 구현되고 있다.
도14. <빛을 찾아서>, 합판에 유채 및 파피에 콜레, 나무, 54.4×40.5cm, 1975.
이 작품 역시 나무판 위의 콜라주 작품으로서, 나무 합판의 겉 표면을 뜯어내고 그 위에 종이를 바르고 유화물감을 칠하고 다시 종이들을 겹쳐 작업한 파피에 콜레를 하고, 합판에서 뜯어낸 나무 조각을 사각형, 반원형 형태를 만들어 붙여 재료와 기법을 시도한 ‘콜라주’작업이다.
3. 1980-1990년대
도15. <가득참과 비움(마음의 소리, Pleine et Vide)>, 캔버스에 유채, 나무, 100×100cm, 1981.
1970년대 중반 무렵 ‘우주의 노래’, ‘태양의 산책(햇님 나들이)’, ‘은하수의 길’ 등의 제목과 함께 둥근 원형, 원반 모양의 형태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원형 형태는 빛의 탐구와 빛의 근원인 태양과 우주를 상징하는 공간의 형태이기도 하며, 1980년대에 우주 주제의 그림에서 다시 구현되고 있다. <가득참과 비움(마음의 소리, Plein et Vide)>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만, 불어의 제목에서처럼 우주의 무한한 공간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도16. <진공묘유(眞空卯酉, Dans le vrai vide se révéle le mystére), 캔버스에 유채, 닥지 콜라주, 1982.
이 작품은 중심에서 원들이 흩어지는 듯 온전한 형태의 동심원에서 시작하여, 끝부분의 겹쳐진 원형에서 파도의 포말처럼 퍼져나가는 우주의 진동을 보여준다. <우주 시리즈> 작품들은 우주의 진동이 중심부의 텅 빈 공간으로부터 에너지가 외부로 퍼져나가고 그 진동을 후광들의 반복으로 시각화 하는 작품들이다.
도17. <영원의 시선>, 52×52cm, 닥지, 유채, 톱밥, 1980.
원형의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우주와 태양 등 빛의 탐구와 우주의 무한한 공간감을 드러내주는데, 특히 이 작품에서와 같이 우주의 진동을 보여주듯 흩어진 여러 형태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반복도면서, 우주의 광대함과 극미의 세부적인 형태들을 함께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 시기 유사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도18. <대지로부터(Par le corps de la terre)>, 지점토, 자연채색 및 아크릴, 먹, 122×100cm, 1989.
1989년에 방혜자는 파지를 이용한 ‘지점토 기법’을 개발하는데, 이 작품은 지점토 기법으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점토 기법은 파지 종이를 물에 불려 풀(자연 접착제)를 섞어 두껍게 편 후, 그 위에 먹, 자연안료, 아크릴 물감 등을 바른 콜라주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점토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이전의 물감의 두터운 마티에르를 이용한 작업들과 파피에콜레로 종이를 겹쳐 붙이는 작품들보다도 더욱 두께감이 있으며 부조와도 같이 입체감을 보여준다.
도19. <붓 속의 나>, 캔버스에 유채, 한지, 콜라주(붓을 캔버스에 붙임), 자연채색, 56×46cm, 1994.
이 작품은 그림을 그리던 붓 자체를 캔버스 위에 붙인 콜라주 작품이다. 여기서 붓은 그림의 화가를 상징하는 오브제이며, 붓 자체의 두께로 인해 부조와 같은 입체감을 준다. 작가가 그동안 콜라주 작품에서 사용한 톱밥, 흙, 종이, 헝겊, 가죽, 사포 등의 다양한 재료들의 결합과는 달리 한 개의 붓을 붙여 오브제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간결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도20. <별들의 노래, Chant Stellaire>, 캔버스에 구긴 한지, 먹, 아크릴, 유채) 풀을 바른 닥지에 유채, 116×81cm, 1987.
1980년대의 우주, 태양, 빛의 세계를 표현한 많은 작품들과 같이 우주의 먼 공간에 떠있는 별들과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우주를 표현한 작품들은 앞서 살펴본 원형형태의 작품들과 유성형태의 작품들이 다수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사각형 형태로 전경(前景)의 별들 너머 푸른색의 하늘 속의 무한한 우주의 시원(始原)으로 향하는 작가의 시선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시기 제작된 우주, 은하수, 별의 노래, 별의 춤 등의 제목들의 작품들은 빛의 존재와 물리적 광선 그리고 광대한 우주를 여러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도21. <대지의 숨결>, 지점토, 자연채색, 루씨용의 황토, 55×46cm, 1996
남프랑스 루씨용의 황토(모래, 흙)의 발견은 방혜자의 화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 1996년부터 방혜자는 루씨용의 황토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방혜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실험하고 작품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료들이 화면의 질감과 물성을 풍성하게 하는 재료들이었다면 루씨용의 황토는 그 자체로 빛을 머금은 자연자체의 안료(자연채색)로서, 다양한 색의 진동과 빛의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영감을 준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루씨용의 황토를 사용하여 지점토 위에 먹으로 대지와 자연의 숨결을 형상화하였다.
도22. <제목없음>, 무직천, 자연채색, 아크릴릭, 67×64cm, 1997.
1997년에는 새로운 합성 재료 제오 텍스타일(비딤, 부직포, 무직천 등으로 다양한 용어로 쓰이는데, 이 천은 합성재료로서 대량생산되는 제품으로 연구팀에서는 용어를 통일하여 무직천으로 사용한다.)을 발견하여 투명한 닥지의 효과를 대신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은 무직천의 성긴 직조감이 물감 사이로 보이는데, 이후 방혜자는 닥지(한지)를 대신하여 무직천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빛을 구사하는 효과적인 재료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4. 2000-2010년대
도23. <빛의 숨결>, 무직천에 자연채색, 루씨용의 황토, 50×42cm, 2002.
도 22에서처럼 이 작품은 무직천을 이용한 작품으로서 성긴 천의 표면에 중앙에 노란 색조의 빛이 화면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듯 풍부한 공간적 깊이를 표현해내고 있어 제목처럼 빛의 미세한 숨결들이 진동하는 듯 보인다. 무직천은 매끈한 질감과 거칠고 성긴 질감의 다양한 직조를 가지고 있으며, 방혜자는 무직천을 이용하여 양면에 물감을 발라 물감이 다른 면에 스며들도록 하여 색조의 변화와 농담(濃淡)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한다. 방혜자는 이 작품 외의 여러 작품들에서 무직천에 루씨용의 황토, 천연채색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빛을 표현해내고 있다.
도24. <빛의 숨결>, 무직천에 자연채색, 100×100cm, 2005.
이 작품은 이전부터 사용해 온 양면채색기법을 무직천에 적용하며, 반복적인 형태들로 화면의 전면을 구성해나가고 있는데 마치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락(Jackon Pollock)의 전면균질회화(all-over painting)와 같이 화면 전체가 시작과 끝이 없는 구성을 보여준다. 반복적 형태로 보여지는 청색과 보라색조의 형태 속에 방혜자가 자주 반짝이는 빛의 하이라이트를 줄 때 사용하는 금빛 파스텔의 반점들이 보인다. 파스텔 이리즈(pastel irisé)라고 불리는 이 무지갯빛 파스텔은 크레용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금박을 얹어 놓은 것과도 같은 효과를 주며 화면 위에 밝은 빛의 액쎈트를 줄 때 자주 사용하는 재료이다.
도25. <대지의 빛>, 무직천에 자연채색, 72×129cm, 2006.
광활하고 희미한 대지의 여명을 깨우듯 어두운 화면 중앙에 가늘게 비추는 빛의 긴 조각은 곧 빛이 퍼져 대지를 환하게 비추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방혜자는 이러한 구도의 작품들을 직사각형과 원형의 형태로 제작했고, 이 작품과 유사한 원형 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제작하였다.
도26. <하늘 위의 토지>, 자연채색, 86×133cm, 2008.
이 작품은 위의 도25의 다양한 원형 버전 작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늘고 긴 중앙의 빛이 주변의 여러 색조와 어우러지면서 전 화면으로 퍼져 나가는 광원(光源)의 줄기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2008년에 작가 박경리에게 선물한 작품으로 현재 원주 토지문화재단 사무실 건물 복도에 걸려있다. <토지>라는 대작의 이야기가 이 작품 속에 녹아든 것처럼 여명 속에 오롯한 빛을 드러내고 있다.
도27. <우주의 진동>, 36×36.5cm, 무직천에 자연채색, 2014.
도28. <우주의 진동 작품 뒷면>, 36×36.5cm, 무직천에 자연채색, 2014.
2000년대의 원형 형태의 우주시리즈 작품들은 이 작품과 같이 행성의 원반 모양과 같은 형태 속에 추상적인 그림자 혹은 에너지들의 형태가 불규칙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무지갯빛 파스텔의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처리로 원형의 형태가 볼륨감을 나타내면서 둥글게 빛나는 행성처럼 보인다. 이러한 그림들은 2010년대 작품들에서 원형뿐 아니라 사각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도30. <빛의 탄생>, 닥지에 자연채색, 아크릴릭, 129×129cm, 2014.
이 작품은 2010년대의 많이 제작된 유형의 작품으로 중앙의 밝은 빛의 형태가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청색 혹은 푸른색조로 점점 짙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달리 보면, 푸르고 깊고 어두운 무한한 우주의 공간에서 점점 행성의 밝은 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중앙으로 갈수록 붉고 노란 색조로 변하다가 프리즘의 빛처럼 흰 공간으로 환원되고 있다. 물성의 핵에서 점차 퍼지는, 혹은 무한한 깊이의 공간에서 흰 공간으로 수렴되어가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작품들은 이후 샤르트르 성당 유리화 작품에서 중앙의 동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31.32.33.34 <살페트리에르 소성당 설치 작품>, 2003.
2000년대 이후 방혜자는 기존에 작업하던 주제와 화풍들을 여러 버전으로 제작하는 한편 전시와 설치를 통해 공간적인 지경을 넓힌다. 특히 2003년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생-루이 소성당(Chapelle Sanint-Louis de la Salpêtrière, Paris)에서 열린 개인전은 ‘공간’과 작품과의 조응을 실현한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이며, 공간특정적(space-specific) 전시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전시에서 살페트리에르 소성당(예배당) 벽의 건축적 특성에 따라 평면적인 회화 작품들은 창문의 빛을 받도록 바닥에 눕혀 놓거나, 실린더 형태로 둥글게 말아 천정에 매달았고, 캔버스라는 액자틀 없이 무직천 그대로를 벽면에서 흘러내리도록 연출하였다. 건축적인 배경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이 전시는 개별적인 작품들이 건축적 배경과 만나 서로 조응하는 총체적 공간을 보여주며, 그동안 방혜자가 개별 작품들에서 성취하려했던 ‘빛’의 표현이 특별한 건축적 배경과 만나는 ‘빛’의 경험적 공간을 보여준다.
도35.36.37.38.39.40. <환기미술관 전시장면과 작품들>, 2007
2003년 건축적 공간과 작품이 만나 새로운 빛의 공간으로 연출한 살페트리에르 개인전 이후 방혜자는 영은미술관, 성곡미술관, 환기미술관 등의 국내전시와 해외에서 개최된 많은 전시를 통해 공간특정적인 작업들을 보여준다. 예컨대, 환기미술관 전시장면과 작품들에서도 공간을 이용한 설치작업들이 보인다. 둥글게 굴곡진 건물 벽을 따라 작품을 배치하고(도35), 평면작품을 원통으로 말아 실린더 모양으로 천정에 매달리게 설치하고(도36), 살페트리에르 전시에서처럼 빛이 들어오는 창 아래 바닥에 작품을 설치하고 문을 통한 공간 너머에 다른 작품이 보이도록 배치하여(도37) 보는 각도와 시점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도38. <김환기 선생님께 경의를 드리며>, 환기미술관 창문설치,
한지에 자연채색, 색유리, 2007.
또한 전시장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김환기 선생님께 경의를 드리며>는 유리 위에 채색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니고 한지 위에 색유리판을 얹고 원형의 동심원의 형태를 물감으로 그려서 전시장 창문에 맞게 배치한 작품이다. 창문으로 비추는 빛은 한지를 통해 투명하게 배어나오며, 한지 위에 붙여진 색유리판에 투영되어 마치 유리창 자체에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보인다.
도39. <새벽, Aurore>, 무직천에 천연채색, 44×48.5×3cm, 2004.
도40. 환기미술관 2007년 전시 장면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도 그동안 작가가 꾸준히 탐구해온 파피에 콜레, 콜라주 등의 기법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물성에 대한 실험과 조형적 모색을 시도한다. <새벽>(2004, 도39), <빛의 탄생>(200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작품의 표면은 물감이 칠해진 회화적 평면을 유지하면서도 무직천을 겹쳐서 두께(3cm정도)를 두텁게 하여 부조와 같은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40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시장 벽면에 걸린 작품들은 입체적인 두께와 물질성을 잘 보여준다.
도41.
도42.
도43.
도44.
2000년대 방혜자 작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화업은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실 스테인드글라스를 위한 유리화 작업(Vitraux pour la salle capitulaire de la Cathédrale de Chartres)일 것이다. 방혜자 작가는 2018년 샤르트르 대성당 종교 참사회의실에 새로 설치되는 4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작가로 선정되어, <빛의 메시지(Message de Lumière)>라는 주제로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실 북쪽 아치형 창문에 두 개(도41, 42) 남쪽 아치형 창문에 각각 두 개씩(도43, 도44) 스테인드글라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스테인드글라스 아치형태의 창은 승천을 표현하며, 기존 회화작품들의 직사각형 작품들과 원형 작품들이 하나로 만나며 동심원의 원형에서부터 확산되는 빛이 세로의 수직형태의 빛의 길과 만나 창조주의 세계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샤르트르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특별한 장소를 위해 제작한 작품들로서 진정한 장소특정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 종교 참사회의실의 4개의 아치형 창문에 설치, 전시될 유리화는 그간 방혜자의 오랜 화업에서 추구한 빛을 향한 지난(至難)한 여정과 모색의 결과로서, 천상의 빛을 향한 찬란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도45. 도46.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 유리화 공모에 제출한 방혜자의 포트폴리오>
방혜자는 2012년부터 독일 페테르스 공방에서 유리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페테르스 공방의 협업으로 공모전에 참여하여 포트폴리오(도45. 46)를 제출하였다. 이 공모는 18명의 심사위원이 6개월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도47.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실 유리화 본 작품 제작과정을 위한 회의 장면>, 2020년 6월 25일 작가가 직접 메일로 보내온 사진.
도48. <샤르트르대성당 참사회의실 유리화 페테르스 공방에 전시 장면>, 2020년 6월 25일 작가가 직접 메일로 보내온 사진.
2012년부터 독일 페테르스 공방에서 유리화 작업을 시작한 방혜자는 샤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작품을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작품을 유리화로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페테르스 공방과의 회의를 진행한다. 작가가 보내온 수백여점의 사진가운데 하나인 이 사진은 작품이 설치될 샤르트르대성당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12-13세기의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곳으로서 많은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거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도47)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유리화(도48)는 현재 페테르스 공방에서 샤르트르대성당 종교참사회의실로 설치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도47의 사진 왼쪽부터,
1. M. Vockel-BöhnerM : Glasmalerei Peters Studio 프로젝트 관리 담당
2. Frédéric Aubanton : 문화유산 분야 보존 전문가
3. Daniel Alazard : 문화유산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
4. Irène Jourd’heuil : 문화유산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
5. Maximilien Philonenko : 건축유산(성당) 분야 전문가
6. Marie-Suzanne de Ponthaud, 고건축 문화유산 수석 건축가, 복원 설계관리 담당
7. Christa Heidrich 페테르스 공방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겸 복원 전문가
8. Wilhelm Peters 페테르스 공방 대표

작가영상
일러두기
일러두기 바로보기 
▣ 서 문
방혜자 작가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60년 넘게 창작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개최한 전시의 브로슈어와 리플릿, 전시도록, 다수의 화집과 수필집, 전시회에 대한 신문과 잡지의 기사, 인터뷰 기사 등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한 그에 대한 구술채록문(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발간, 2007)도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 화업과 이력에 비해 방혜자 작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이브와 학술적 연구는 부족하다. 단행본으로는 윤난지의 『마음의 빛 : 방혜자예술론』(풀잎, 2009), 연구논문으로는 정은미의 「방혜자 회화에서의 ‘빛’의 의미에 대한 연구」(명지전문대학논문집 제29집, 2005)가 있을 뿐이다. 도록의 경우도 전시 관련 도록이거나 특정 기간에 국한된 작품을 수록한 도록이 대부분이다. 이는 작가의 작품량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작품 자체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팀의 아카이빙 작업은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의 조사․ 수집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르코예술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힐리언스 선마을, 토지문화재단,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 개화사 등 다수의 소장처의 자료를 조사했다.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방혜자 작업실에 소장된 작품과 자료 또한 전수 조사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해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방혜자 작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연구팀이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현지 연구원을 섭외해 파리와 아죽스의 방혜자 작업실과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한국에서 분류․ 정리해제했다. 또한 방혜자 작가의 동생 방훈(예술감독, 캐나다 거주)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
이번 방혜자 아카이빙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혜자 미술 60여 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방대한 양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방혜자 미술의 흐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다양한 세부 정보를 포함시켜 재료 및 기법 실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혜자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평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방혜자 작가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창작하고 전시했기 때문에 작품 제목은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어 제목을 프랑스어로, 프랑스어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료와 기법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번 아카이빙에서는 동일 작품의 제목과 재료․기법의 표기를 최대한 통일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미공개작 380여 점을 확인하고, 희귀자료(서울대 미대 성적표, 서울대 미대 졸업앨범 등)를 확보해 목록화함으로써 방혜자 작가의 삶과 미술을 좀 더 입체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방혜자 작가의 유리화(스테인드글라스)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확보했다. 그는 2018년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유네스코 세계유산, 13세기) 참사회의실에 새로 설치하는 유리화 작가로 선정되었다. 방혜자 작가는 2019, 2020년 독일의 페테르스 공방에서 대형 유리화 4점을 제작했으며 그것을 2021년 설치하게 된다. 제작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다채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이번 아카이빙 작업의 결과물은 방혜자 작가 연구의 본격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혜자 작가의 위상과 미술적 성취에 비해 국내에서의 학술 연구가 절대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대한 작품과 관련 자료를 풍부하고 일목요연하게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일러두기
1. 자료 수집 범위와 내용
∙ 범위 : 1952년~2021년
∙ 내용 :
작품 : 총 1,293건(대표 외 기타 이미지 포함 1,332여 건)
작품 외 : 총 621(대표 외 기타 이미지 포함 992 여 건)
리플릿, 브로슈어, 초대장, 포스터, 사진, 삽화, 엽서, 공문, 보고서, 전시관련문서,
작업스케치, 서신, 상장, 기타
참고문헌 : 총 508건(대표 외 기타 이미지 356여 건)
단행본, 도록, 영상, 웹자료, 신문기사, 정기간행물, 논문, 기타
전시이력 : 총 287건(개인전 96건, 단체전 191건)
작가연보 : 총 96건
인 용 문 : 총 79건
2. 시스템 입력 관련 참고 사항
∙ 작품명 관련 작가 의견 : 2020년 8월
단행본이나 도록, 브로슈어, 리플릿 등 작품과 관련된 기록물에 작품명 정보가 없을 경우 <무제> 혹은
∙ 동일한 작품이더라도 작품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혹은 서로 다른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작품명이 있는 경우를 우선 '본제목'으로 '확정' 선택함. 유사 제목의 경우(불어, 한자 번역에서 오는 차이) '본제목', '확정' 후 '대등제목', '병기' 추가함. 전혀 다른 제목일 경우 작가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본제목'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제목은 '이형제목'이 없어 '본제목'을 선택하는대신 ‘확정’이 아닌 '입력'을 선택함
∙ 시화집에 수록된 작품과 관련된 작가 의견 : 20201년 2월
『그윽한 기쁨』(샤를 줄리에 시, 방혜자 그림, Voix d'encre 2002년), 『화개』(김지하 시, 방혜자 그림, Voix d'encre 2006년), 『침묵의 문으로』(로즐린 시빌르 시, 방혜자 그림, 방훈·영은미술관 2006년) 등과 같은 시화집에 수록된 작품의 경우 시의 내용을 보고 그린 작품들이므로 ‘개별작품’으로 보기 보다는 시와 함께 있을 때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함께 감상하길 바람 / 시화집의 경우 작가의 의견대로 시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저작권 문제가 있어 작품만 등록함
∙ 작품 유형 분류 관련
지점토 : 평면>회화
유리화 : 평면>회화(공예로 분류하지 않음)
수묵담채화 : 평면>회화(동양화로 분류하지 않음)
∙ 작품 재료 및 기법 관련
pigments naturels : 천연채색, 천연안료, 자연안료, 자연채색 등으로 번역되어 있을 경우 자연채색으로 통일
pastel irisé : 파스텔
papier mâché : 지점토
papier de mûrier : 닥지
papier coréen : 한지
bidim, géotextile, nonwoven : 비딤, 부직포, 무직천 등으로 번역되어 있을 경우 무직천으로 통일
sable de Roussillon, ocres de Roussillon : 루씨용의 황토, 모래, 흙 등으로 번역되어 있을 경우 루씨용의 황토로 통일
∙ 문장부호 관련
전시명 《 》
작품명 < >
단행본, 도록, 간행물명 『 』
논문제목, 기사제목 「 」
∙ 참고문헌 중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은 이미지 등록이 아닌 URL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프랑스에서 수집한 기록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온라인 환경이 차이가 있어 이미지를 등록함
∙ 주요 인물명 표기
Gilbert Lascault : 질베르 라스코
Charles Juliet : 샤를 줄리에
Pierre Courthion : 피에르 쿠르티옹
Olivier Germain-Thomas 올리비에 제르망 또마
Pierre Cabanne : 피에르 카반느
Nelly Catherine : 넬리 카트린(Catherine가 Catherin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많음)
Léon Zac : 레옹 자크
Roselyne Sibille : 로즐린 시빌르
André Sauge : 앙드레 소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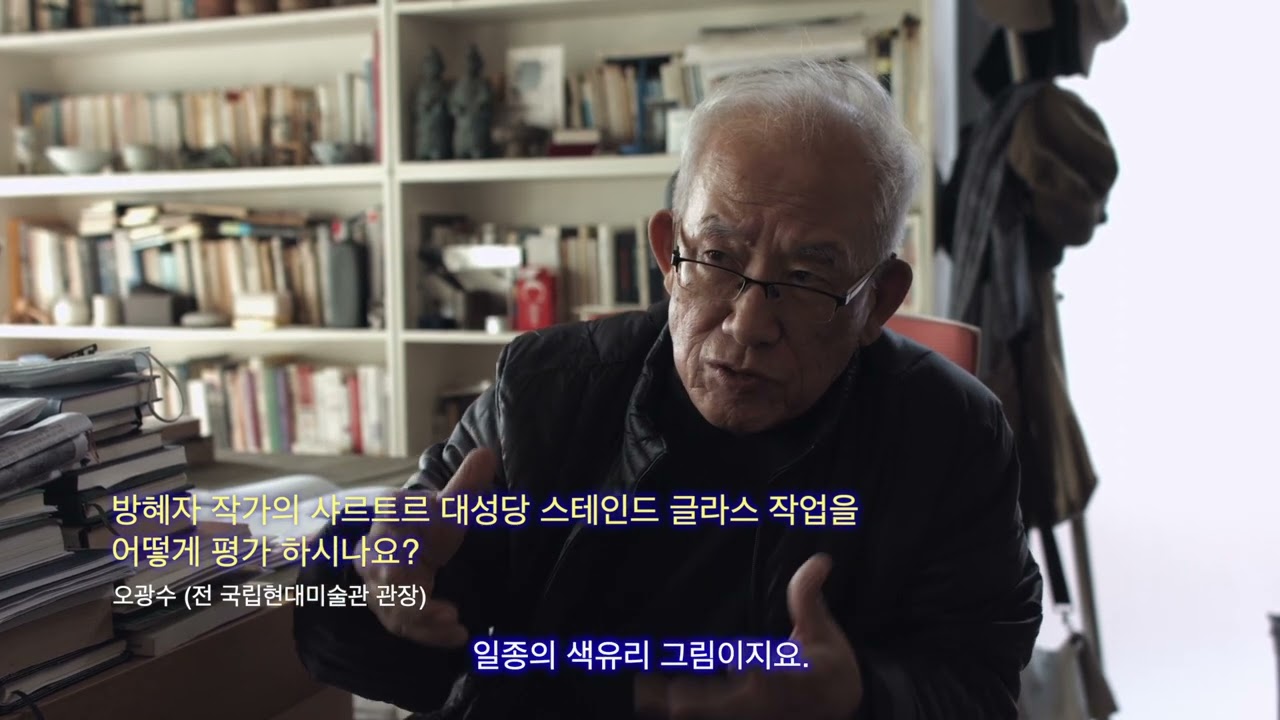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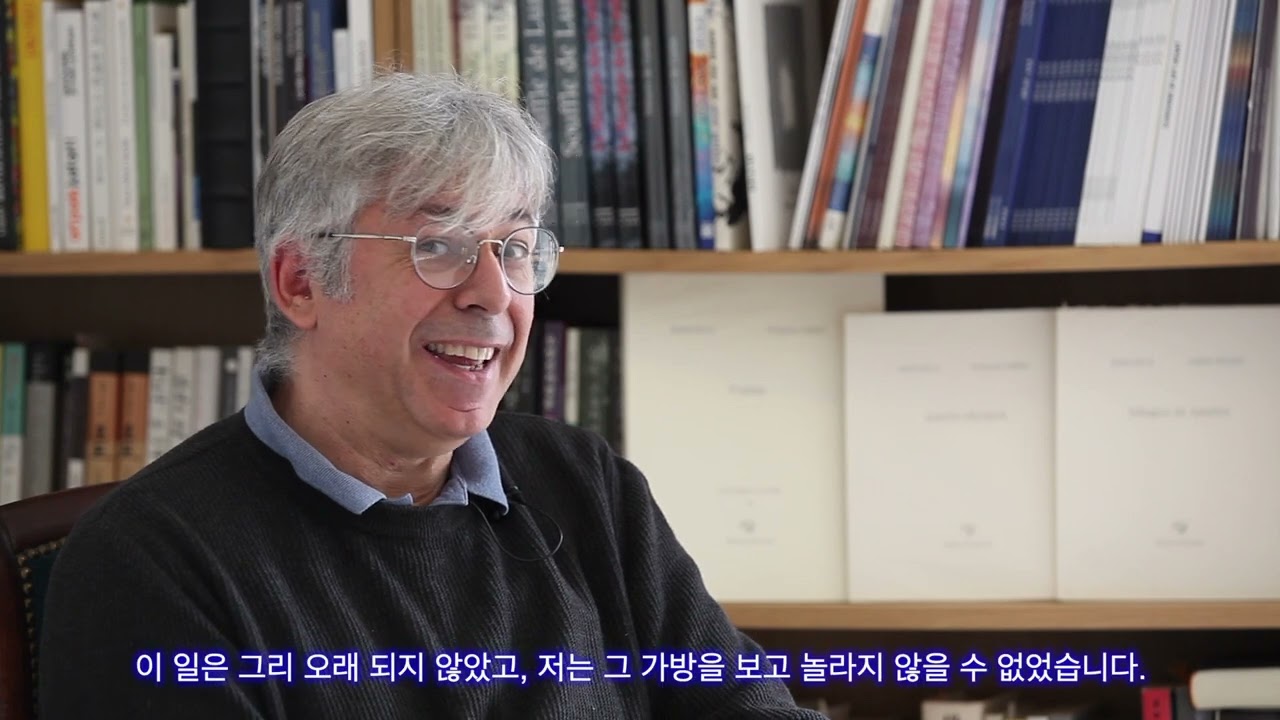


 목록
목록